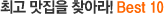|
|
향기로운 길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
| 글쓴이: 물방울 | 날짜: 2009-02-26 |
조회: 2948 |
|
|
|
http://cook.daemon-tools.kr/view.php?category=Q0wNNFE7VSpCNQxJT1U%3D&num=EhhIdBY%3D&page=48

|
사실 길을 찾는 데에는 후각만으로도 충분하다. 향기로운 길을 따라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근사한 커피를 내어놓는, 지글지글 구이를 굽고 있는 그곳에 당도할 수 있다. 후각을 잔뜩 자극하는 그 길을 소개한다.
 |
“여기가 바로 내수동이라는 곳이란다.” 2년 전 연애박사 선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동네에선 커피 향이 난다고 생각했다. 얼마 후 그 커피 향이 궁금해져 혼자서 다시 그 길을 찾았을 땐, 커피 향이 더 났다. 대체 누가 이 길에 커피 가루라도 뿌린 것일까.
길을 걷고 또 걷다 보니, 내수동 교회 뒤편으로 ‘coffeest’라는 범인(?)을 찾아낼 수 있었다. 성곡미술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이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커피 향이 이 길을 그윽하게 물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쩜, 이 집 하나만으로 이렇게 커피 향이 온 동네에 진동할 수 있을까. 동네를 또 뒤지고 뒤지다 보니, 원인은 다름 아닌 ‘조용한 주택가’라는 데 있었다. 워낙에 들고 나는 사람 없이 차분한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 동네에선 낙엽이 굴러 떨어지는 소리까지 들린다. 그러니 그 진한 커피 향은 당연지사 머물러 있을 수밖에. 그러니 이 길은 커피 향을 ‘머금었다’는 표현이 어울리겠다.
하나의 카페만으로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내수동 교회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자. ‘갤러리 정’ 건물의 1층에도 진한 커피 향을 내뿜는 ‘커피 볶는 집’이 있다.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건 커피 향뿐만이 아니다. 이 집 앞에는 유난히도 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고, 그 바로 옆에 조용한 벤치 하나가 그림처럼 놓여 있다. 이불처럼 쌓여 있는 낙엽을 밟고, 눈에 보일 듯 느껴지는 커피 향을 만끽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해가 저문다. 커피 향처럼 오래 머물지 않고 흘러가버리는 시간이, 세월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다.
범한서적, 도서출판 일조각, 갤러리 뤼미에르, 성곡미술관 등 각종 출판사와 미술관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길의 끝은, 광화문 씨네큐브와 가든 스페이스로 통한다. 요즘 가든 스페이스에서는 <와인 미라클>이라는 영화를 상영 중이다. 커피 향을 따라 걷다가 이 영화를 보면, 어느새 와인의 향기가 느껴지게 될까? 비단 와인을 코끝에 들이대지 않더라도 이미 반쯤 취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서둘러야 할 무엇이 전혀 없어 ‘coffeest’에 들러 ‘이디오피아 모카하라’를 한 잔 마셨다. 묵직한 맛과 향이 이 길을 또 물들이고 있었다. |
| |
 |
12시 점심 시간. 광화문 교보빌딩 뒤편, 그러니까 종로구청 근처에 들어서면 온통 사방에 비린내가 진동하던 시절이 있었다. 미 대사관 앞쪽으로 생선구이 집이 일렬로 쭉 늘어서 있던 때의 이야기인데, 이곳을 지나치려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감수해야 했다. 첫째, 온몸에 비린내가 배는 것을 용납할 수 있을 것. 둘째, 지글지글 구워지고 있는 생선 한 토막에 눈길을 돌리지 않고 지나칠 수 있을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생선 좋아하는 사람치고 이 길을 그냥 지나치는 자 없었으니, 누구나 반드시 한 번쯤 두툼한 삼치구이 한 조각에 발길이 매이곤 했다.
하지만 요즘 종로구청 근처엘 가면, 어렴풋이 생선구이 향이 느껴지긴 해도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 저기 새롭게 개발되면서 예전의 생선구이 집들이 모두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아아, 이제는 정녕 연탄불에 노릇하게 구워진 생선구이와는 이별을 청해야 한다는 것인가! 한탄하기에 앞서 부리나케 떠오른 곳이 있었으니, 종로3가 서울극장 근처에 위치한 생선구이 골목이다.
찾아가는 길은 어렵지 않다. 서울극장 초입에 ‘서울 종로 귀금속 도매’ 매장이 있는데 그 사이 좁은 골목으로 들어서면 된다. 폭이 채 1미터가 될까 말까 한 이 허름한 길에 들어서면, 거기서부터는 오로지 후각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굳이 간판을 찾지 않아도, 여기 저기 묻지 않아도 된다. 그 좁은 골목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생선구이 향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전주식당과 한일식당을 마주할 수 있다.
손님을 맞는 건 주인보다 생선이 먼저다. 솥뚜껑만 한 고등어가 제 몸에서 이글이글 기름을 뿜어내며 구워지고 있다. 작열하고 있는 건 고등어만이 아니다. 날씬한 꽁치는 네 마리가 동시에, 두툼한 삼치는 커다란 두 덩어리가 석쇠 안에서 꼼짝을 못하고 있다. “이런 곳은 사진으로 남겨둬야 돼. 자꾸만 없어지니까.” 잘 구워진 생선구이로 한 끼 식사를 마친 아저씨 한 분이 이쑤시개를 입에 물고 나오다 한마디 던진다. 몇 남지 않은 생선구이 집에 대한 아쉬움일 것이다.
하루에 4백 명의 손님이 오로지 생선구이를 맛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다. 삼치구이 백반, 고등어구이 백반, 꽁치구이 백반은 5천원이요, 영광굴비 백반은 7천원에 내놓는다. 1인용 압력 밥솥에 담겨 나오는 밥은 윤기가 자르르 돈다. 밥 한 술을 크게 뜨고 그 위에 석쇠 자국이 선명히 박힌 고등어 한 조각을 올려 한 입에 넣었다. 노릇노릇 고등어 몸에 밴 불 맛이 고소하다. 매끈하게 잘 넘어간다.
이 골목을 지나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주위는 온통 생선 굽는 냄새로 진동하기 때문에 ‘인간 비린내’가 되는 것을 미리 감수해야 할 것이다. (행여 여성이라면 머리카락 하나하나에도 온통 생선 냄새가 가득 배게 되니 그 점 또한 참아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온몸이 비린내로 칠갑이 된다 해도, 이 골목을 찾게 되는 이유가 있다. 생선은 이렇게 연탄불에 구워 바로 먹는 것이 최상의 맛이기 때문이다. (꾸덕꾸덕 식은 생선은 찬밥에 가깝다. 그리고 오븐에서 구운 생선, 아예 생선구이라 칭하지도 말자.) 그러니 고등어가, 삼치가, 영광 굴비가 최상의 맛을 낼 수 있는 그 짧은 찰나를 맛보기 위해 ‘인간 비린내’가 되는 치욕쯤은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 잘 구워진 생선구이는 고기 저리 가라다. 그리고 거듭 강조하지만, 생선구이가 맛을 낼 수 있는 그 찰나는 매우 짧다. 그리고 그 잠깐의 순간이 여기 이 골목에 있다. |
| |
 |
사실 꼬치구이만큼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는 음식도 드물다. 길 가는 남정네의 시선을 한몸에 사로잡는 팔등신 미녀처럼, 꼬치구이가 그러하다. 어디에서든 꼬치는 구워지는 후각의, 시각의, 청각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되어 있다. 일단 온 거리를 사로잡는 냄새에 고개를 돌리면, 앞뒤로 제 몸을 굴려가며 구워지는 꼬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되고, 지글지글 구워지는 소리에 또 한 번 놀라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꼬치구이는 제 스스로 손님을 꾀는 묘한 녀석임에 틀림없다.
중국 야시장에 들르면 반드시 눈에 띄는 것이 양고기 꼬치구이다. ‘양로우추안(羊肉串)’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중국인들에게 술안주로, 간식으로 사랑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나 맛볼 수 있는 이 양고기 꼬치구이가 최근 건대 입구에 자리를 틀었다. “처음에는 중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시작했는데, 요즘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어눌한 말투만 딱 봐도 화교인 주인장 아저씨는 이 동네에 가게를 연 지 만 3년 됐다고 했다.
온 거리에 냄새를 풍기며 구워지고 있는 양고기 꼬치구이가 달달한 닭꼬치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 윤기 자르르 흐르게 소스를 덧바른 닭꼬치와는 달리, 양고기 꼬치구이는 꽤 텁텁한 모양새다. 금방이라도 온몸에 묻힌 주황색 향신료 가루가 부슬부슬 떨어질 듯 불안해 보인다. 게다가 중국 야시장에서 먹는 것과는 달리, 크기도 엄청 작아 꼬치 10개는 먹어야 성에 찰 듯 보이니 이건 참 좌불안석의 지경이다. 하지만 이 거리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게 만드는 건, 오묘하게 풍기는 구이 향인데, 이게 참 사람을 끈다.
본래 양고기 꼬치구이는 중간에 기름 덩어리가 (마치 마늘처럼) 하나 들어가야 제 맛이라고 할 만큼 기름이 많다. 그러니 그 기름이 불과 만나 지글거리는 소리는 (작다고 얕보지 말라는) 호통 소리만큼 거세다. 어디 그뿐이랴. 불과 기름이 만난 만큼 이 꼬치가 내뿜는 연기는 은근히 구수하다. 양념이 타는 냄새라기보다는, 잘 구워지고 있는 향이랄까. 그래서 이 거리에선 오로지 숨을 들이마시며 걷는 일만이 가능하다.
중국 야시장에서 1개에 5위안을 주고 먹었던 이 양고기 꼬치구이가 이 골목에선 10개에 7천원 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구수한 냄새에 끌려 우연히라도 이 거리에 발을 디디든, 알고 찾아가든 간에 이 길에 들어서면 반드시 놀랄 일이 있다. 여기가 중국인지 한국인지 헷갈릴 정도로 모든 간판이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온통 길을 사로잡고 있는 꼬치구이 향보다, 사뭇 이국적인 이 거리의 분위기에 한 번 더 취할 것이다. |
| |
 |
더도 덜도 아닌 딱 한 글자, ‘빵’이라고 씌인 빨간 간판을 본 지도 꽤 오래다. 요즘은 ‘빵집’이라는 단어를 사용조차 않는다. 거의 백 퍼센트 ‘베이커리’라는 말을 쓴다. 그리고 그 말 때문인지 ‘빵집’의 향수는 잊힌 지 오래다. 이제 그 어디엘 가도 오리지널(?) 빵집은 없다. 대규모 베이커리 직영점 때문에 동네 빵집은 사라진 지 오래인 것이다. 그러니 요즘은 정말 빵 굽는 냄새라는 걸 느껴본 지가 오래다. 하긴 조각 케이크 한 조각에 무슨 빵의 향기가 묻어 있을까. 봉긋하게 구워져 올라온 식빵 대신, 요즘 우리는 그림처럼 예쁜 타르트를 먹는다.
하지만 여전히 잡고 싶은 추억 중 하나는, 빵집 앞을 지날 때면 이내 콧구멍을 크게 벌려 킁킁댔던 기억이다. 달착지근하고, 고소한 빵 냄새가 아직도 뇌리에 선명하다. 그리고 더 분명하게 얘기하자면, 구워져 나온 빵의 ‘맛’보다 그 앞을 지나다 맡게 되는 빵의 ‘향기’가 더 좋았다.
서울에서 빵의 향기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기억과 동네를 모조리 뒤지고 뒤져도 그 답은 나오질 않는다. 그러니 빵의 향기로 발길을 떼기조차 힘들던 그 골목이 그리워질 수밖에. 그리고 행여, 그 옛날 추억 속 빵집을 찾아 들어간들 실망만 잔뜩 이고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잘 다듬어진 ‘쁘띠 조각 케이크’에 길들여진 우리는 그 퍽퍽하고 거친 빵의 맛이 되레 어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빵의 향기는 그립되, 입맛은 변해버린 이상야릇한 형국이다.
일본은 베이커리가 촘촘히 들어박힌 골목이 많은데, 서울에선 그러한 곳을 찾기조차 힘들다는 점이 아쉽다. 이른바 ‘빵집 골목’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에서 한 집 걸러 빵집이, 아니 베이커리가 들어서 있는 곳이 바로 동부이촌동 메인 도로다. 그러니 아쉬운 대로 우리는 이 길에서 달콤한 빵 향기의 추억을 가다듬을 수밖에 없다.
길의 초입 ‘루시 파이’에서 먹는 파이는 ‘빵의 향’은 나지 않지만 그 맛이 부드럽고 달콤하다. 비슷한 느낌으로 이 동네 길목엔 그 유명한 케이크 전문점 ‘C4’와 베이커리 ‘르노뜨루’가 자리 잡고 있다. 또한 다이칸야마에나 등장할 법한 작고 스타일리시한 카페에서 역시 각종 케이크와 쿠키 정도는 예쁘게 내놓는다.
하지만 우리가 결국 느끼고자 하는 건, 빵 굽는 냄새가 아니었던가! 걱정할 것도 없이 이 길의 끝 즈음에 정답이 있다. 아니, 역시나 굳이 간판을 살펴보지 않아도 아침이면 풍겨 나오는 빵 냄새가 이 길을 정교하게 마비시키고 있다. 베이커리 HEDIARD에서 내뿜는 달달하고, 부드럽고, 버터 같고 우유 같은 빵 냄새가 온 사방에 진동하는 것이다. HEDIARD는 요즘 드물게 옛날 빵을 만날 수 있는 집이다. 수많은 타르트와 조각 케이크 전문점을 뚫고 이 집은 온전히 앙금빵과 버터크림빵, 소보루빵을 구워내고 있다. 그러니 계속해서 코끝을 추억의 한 장소로 가져다놓을 수밖에. “워낙 이 동네는 유동 인구가 없기 때문에 손님이 대부분 늘 드시던 빵만 찾는 동네 분들이죠.” 이 집이 독특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추억의 ‘빵집’ 앞에 데려다놓고도 적당히 세련된 풍미를 자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의 중간 지점을 영리하게도 알고 있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당연히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길목을 사로잡고 있는, 고소해서 눈이 다 감기는 빵의 향기일 것이다. | |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